

KMJArtGallery
조승규 작가 개인전
9.13(토) ~ 9.18(목)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3 KMJARTGALLERY 1관,2관 1F
조승규 - 질서와 혼돈, 감각과 사유가 교차하는 회화적 장(場)
조승규의 회화는 자연과 일상적 대상을 출발점으로 삼되, 이를 단순 재현이 아니라 생명력·깊이·사유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독창적이다. 그는 거칠고 자유로운 붓질과 강렬한 색채의 중첩으로 사물의 본질적 리듬을 드러내며, 「디아판네」나 「시선」에서는 생명과 관계의 긴장을, 「눌림」에서는 내적·사회적 압박을 시각화한다. 특히 「숲」 연작에서 반복되는 수직적 구조는 공간적 깊이와 철학적 성찰의 장을 동시에 열어, 회화가 단순한 풍경을 넘어 존재와 세계를 묻는 매개가 됨을 보여준다. 그의 작업은 질서와 혼돈, 감각과 사유가 교차하는 회화적 실험으로 요약된다.
조승규의 <디아판네> 연작은 단순히 형상적 표현을 넘어, 존재론적 회화라는 새로운 층위를 탐구한다.
인물은 고정되지 않고 흐려지며, 배경은 외부 세계가 아닌 정신의 내면 풍경이다. 그의 작업은 추상과 구상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전통적 서사에서 벗어나 지각과 감정, 기억의 구조를 회화적으로 재구성한다. 이로써 작가는 회화를 통해 ‘보이는 것 너머’를 보여주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으며, 물리적 공간이 아닌 인식적 공간을 열어젖히는 데 성공하고 있다.
〈디아판네 – 쌓아올림〉과 〈디아판네 – 올림〉은 화가 특유의 은유적 시각 언어, 색채의 시적 운율, 그리고 존재론적 고찰이 잘 드러나는 중요한 작품이다. 개념적 맥락에서 볼 때 “디아판네(Diafane)”는 프랑스어 또는 이탈리아어에서 유래된 단어로 ‘투명한’, ‘비치는’, ‘희미하게 드러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 단어가 제목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은, 조승규가 이 회화 시리즈를 통해 가시적인 것 너머의 본질, 혹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내면의 풍경을 시각화하고자 함을 시사한다.
이중 <디아판네 – 쌓아올림>의 중심인물은 입체적 조형감 없이 흐려진 채, 마치 ‘빛의 잔상’처럼 존재한다. 이 인물은 책이나 계단, 혹은 상자 형태의 오브제를 들고 있으며, 이는 기억, 지식, 삶의 층위들을 의미하는 듯하다. 뒤편의 거대한 노란 유기체적 형상은 마치 폐(肺) 혹은 나뭇잎, 생명체 내부를 단면으로 본 듯한 형상이며, 이는 인물의 내면 혹은 "존재의 뿌리"로 해석된다. 푸른 배경은 우주적 공간 또는 정신의 바다를 떠올리게 하며, 좌측의 흰 선들은 무의식 속의 기억, 잊혀진 대화, 영혼의 흔적처럼 나타난다. 청색과 황색의 대비는 ‘차가운 이성’과 ‘따뜻한 생명력’ 사이의 갈등 구조를 보여주고, 인물의 비물질성은 존재론적 불확실성과 연관되어 있다.
<디아판네 – 올림>에서 인물은 엎드려 있는 자세, 거의 땅에 스며들 듯 한 모습이다. 마치 의식을 상실했거나, 자신의 근원으로 되돌아가려는 몸짓처럼 보인다. 주변은 침묵에 싸여 있으며, 바닥에 놓인 동그란 오브제는 의식의 중심, 혹은 지각의 창처럼 작용한다. 등 뒤에 펼쳐진 녹색 형상은 이전 작품과 유사하지만, 이번엔 더 자연적이고 유기이다. 이 나뭇잎 모양은 마치 한 인간의 기억지도처럼 구성되어 있으며, 인물은 그 내부로 흡수되고 있는 구도자처럼 보인다. 전체적으로 어두운 색조는 침묵, 내면의 성찰, 고독을 드러내는 듯 하며, 녹색은 치유와 생명의 색이지만, 동시에 무거운 긴장을 머금고 있다. <디아판네> 연작은 한 인간의 내면 여정을 시간의 선형성과 원형성으로 양분하여 보여준다. 전자는 ‘살아내는 자아’, 후자는 ‘돌아가는 자아’이다. 이는 마치 시작과 끝, 의식과 무의식, 살아있는 몸과 비물질의 영혼처럼 연결된다.
숲-Tie(깊이), 숲-Phi(성찰)
이번 개인전에서 조승규는 주목할 만한 회화적 실험을 반영하는 ‘숲’연작을 선보이고 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축, “숲-Tie(깊이), 숲-Phi(철학적 성찰)”을 바탕으로 회화적 탐구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연작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수직적 반복 구조이다. 나무 기둥과 같은 형태가 병렬적으로 늘어서 있으며, 이는 단순한 풍경묘사가 아니라 리듬과 패턴, 그리고 깊이의 생성을 지향한다.
‘숲-Tie’ 연작은 색조가 비교적 절제되어 있고, 숲의 밀도와 구조적 반복을 통해 ‘깊이’의 개념을 시각화하고 있다. 화면은 단순히 앞뒤의 원근감이 아니라, 시선이 층층이 쌓이는 과정 그 자체를 ‘깊이’로 환원된다. ‘숲-Phi’ 연작은 보다 화려하고 다채로운 색채가 배경과 수간(樹幹)을 채우며, 숲이라는 장소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사유의 장(場)’임을 드러낸다. 화면의 세부에서 빛나는 붓질과 색의 파편은 마치 사유의 흔적처럼 흩뿌려져 있다.
<숲 – Tie>는 나무줄기의 반복을 통해 화면 속에 무한히 이어지는 듯한 공간적 깊이를 강조한다. 하지만 이는 전통적 원근법의 깊이가 아니라, 겹겹이 포개어진 층위와 시각적 진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회화적 깊이이다. 숲은 단순히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무한히 스며드는 시선의 길이자 내면적 탐구의 통로가 된다. 작품에서 반복되는 수직 구조는 명상적 질서를 부여하며, 보는 이로 하여금 화면 속으로 천천히 침잠하게 이끌고 있다. <숲 – Phi>는 색채적 밀도가 한층 더 높아지고, 화면 전반에 사유적 흔적이 스며있다. 여기서 숲은 단순히 ‘깊이의 대상’이 아니라, 존재와 관계, 세계와 인간을 매개하는 은유적 공간으로 확장된다. 나무줄기 사이에 흩뿌려진 색의 파편들은, 존재들의 흔적 혹은 사유의 잔광처럼 보이며, 숲을 철학적 대화의 장으로 전환시킨다. 이 지점에서 숲은 하나의 배경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질문이 부유하는 현장으로 변모한다. 보는 이는 나무 사이로 시선을 밀어 넣으며, 숲속에 잠재된 ‘철학적 울림’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조승규의 ‘숲’ 연작은 자연의 단순한 재현을 넘어, 시선·깊이·사유라는 층위를 회화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숲-Tie>는 시각적·공간적 깊이를 통해 숲에 잠기는 체험을, <숲-Phi>는 색채적·사유적 울림을 통해 숲을 통한 성찰을 제시한다. ‘숲’은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라, 회화가 어떻게 세계와 인간의 관계를 묻고, 또 그 속에서 철학적 질문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실험인 것이다. 반복되는 수직의 구조는 인간 존재를 둘러싼 질서이자 울림의 리듬이고, 색채의 파편은 그 질서를 흔들며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
이경모/미술평론가(예술학박사)
조승규 작가의 경력 및 작품(전시장에 더 많은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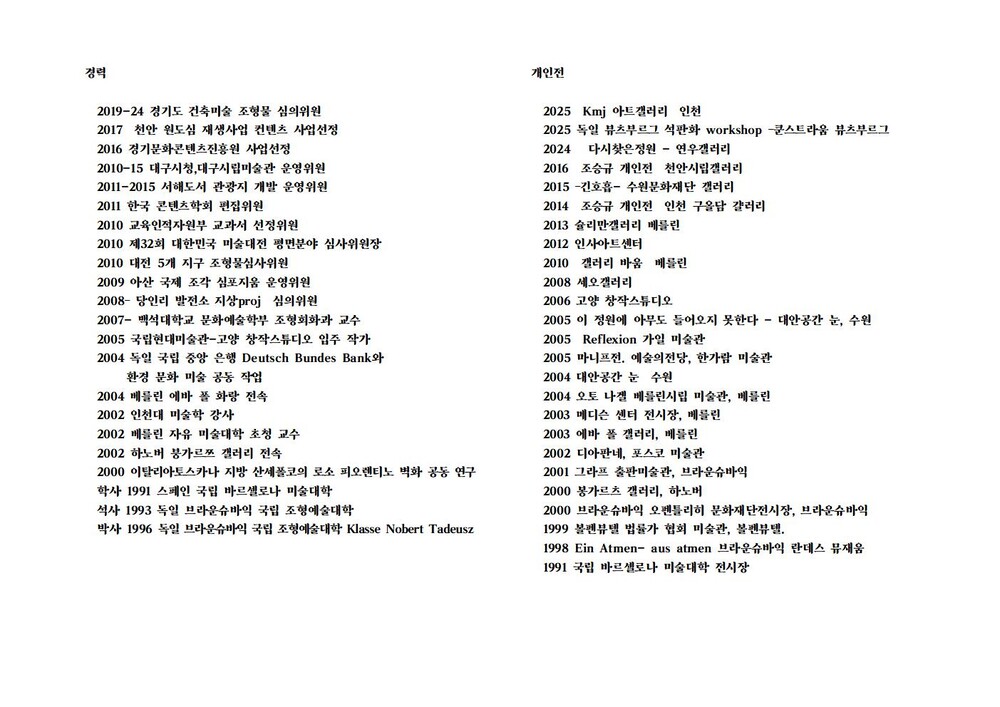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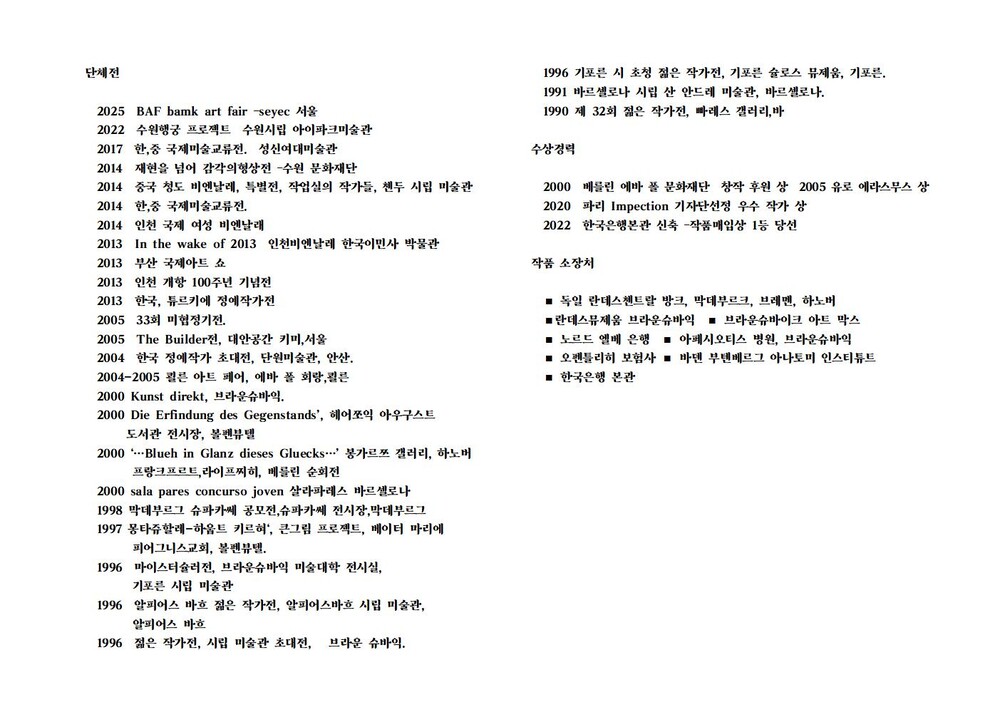
KMJ ART GALLERY
작품 구매 문의